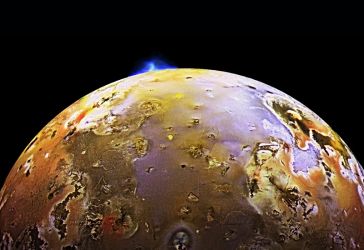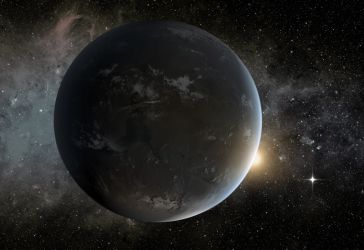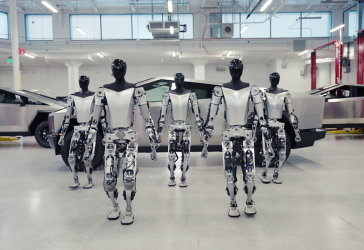식물은 외부 침입을 감지하면 세포를 다시 프로그래밍해 일종의 ‘전투 모드’에 돌입한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듀크대학교 연구팀은 최근 논문에서 식물이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침입을 받으면 전투력을 올리기 위해 단백질 번역(합성)에 치중하는 나름의 ‘전투 모드’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동물과 달리 식물에게는 면역 세포가 없다는 사실에서 출발했다. 연구팀은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혈류를 타고 감염 부위로 달려가 싸울 면역 세포를 보내는 동물과 비교해 식물은 어떻게 버티는지 의문을 가졌다.
연구팀은 지난 2017년 바이러스에 감염된 식물 일부의 메신저RNA(mRNA, DNA의 유전정보를 세포질 속 리보솜에 전달)가 단백질로 번역되는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밝혀냈다. 여기서 번역이란 DNA 정보가 mRNA에 의해 전사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 같은 사실을 근거로 연구팀은 같은 종류의 식물을 화분에 나눠 심고 일정 기간 재배한 뒤 바이러스를 주입했다. 화분 하나는 그대로 뒀고 다른 하나는 mRNA 번역을 임의로 촉진해 단백질 번역을 빠르게 했다. 단순히 속도만 낸 것이 아니라 식물이 전투력을 키우는 동시에 기존 생장을 멈추지 않도록 조정했다.
그 결과 바이러스를 주입하고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식물은 단백질을 증산해 싸우느라 성장이 느려졌다. 반면 단백질 생산과 기존 생장을 적절히 조절한 식물은 바이러스도 물리치고 성장도 정상 속도를 보였다.
실험 관계자는 “전투를 앞둔 국가는 싸움에 우선순위를 두고 전시 체제에 돌입하므로 국가 성장은 당분간 포기한다”며 “식물도 마찬가지다. 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한 단백질을 합성하면서 그 외의 것은 만들지 않게 돼 성장이 둔화된다”고 전했다.
이어 “식물 세포 내 단백질은 이물질 인식과 화학적 메시지 전달, 노폐물 배출 등 다양한 역할을 한다”며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 세포핵에 담긴 DNA 명령이 mRNA 분자로 전사되면 mRNA 사슬은 세포질로 향하고, 거기서 리보솜에 의해 명령이 읽혀 단백질이 제조(번역)되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연구팀은 이번 실험에서 mRNA 끝부분에 유전적 코드가 반복되는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도 알아냈다. 식물이 ‘전투 모드’에 들어갈 경우 코드 반복을 활용, 방어 단백질을 증산한다는 게 연구팀 설명이다.
실험 관계자는 “식물이 병충해나 세균 등과 싸움에 에너지나 자원을 소비하면 스스로의 생명을 지탱하는 광합성 같은 활동은 제대로 못해 엉망이 된다”며 “자신을 보호하면서도 성장을 유지하는 균형을 모든 식물을 대상으로 알아내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실험은 병충해에 잘 버티면서도 성장은 느려지지 않는 식물 개량의 단초를 제공했다”며 “식량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 수확량을 줄이지 않고 질병에 강한 작물을 개발할 수 있을지 모른다”고 기대했다.
정이안 기자 anglee@sputnik.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