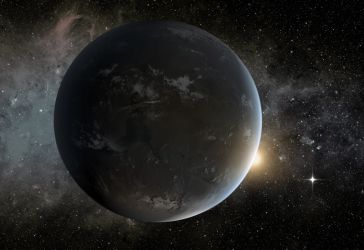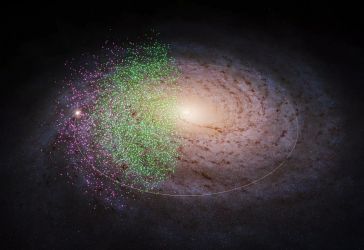인체는 지금까지 학계가 추측한 것보다 고온다습한 환경에 훨씬 약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일정 수준을 넘어선 습도와 온도는 온열질환을 부르는 등 인체에 치명적이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교 연구팀은 12일 국제 학술지 '응용생리학 저널(Journal of Applied Physiology)'에 공개한 논문에서 인간이 견디는 습구온도 한계치를 기존보다 최대 7℃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팀은 지금껏 인간이 견딜 수 있는 습구온도 상한선이 습도 100%에서 35℃, 50%에서 46℃로 알려졌지만 이는 의미가 없다고 가설을 세웠다. 습구온도란 온도계를 축축한 천으로 감싸고 측정한 값이다.
인체는 기온이 올라가면 땀을 배출해 체온을 조절한다. 다만 습도가 너무 높으면 땀의 증발이 느려지다 멈추는데, 이는 습구온도가 35℃일 때 발생하는 현상이다. 땀이 더 이상 피부에서 증발되지 않으면 인체는 체온 조절이 불가능해지고 방치되면 심장마비 등이 발생한다.

연구팀은 인체가 습구온도 35℃를 견딘다는 건 이론과 모델이 도출한 결과이며, 지구온난화 탓에 폭염이 빈발하는 미래에는 도움이 안 된다고 봤다. 때문에 인간이 견딜 습구온도의 한계를 다시 측정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연구팀은 18~24세 남녀 24명을 동원해 실험에 나섰다. 습구온도의 최상한선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온도에 보다 잘 견디는 건강한 젊은이들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몸의 중심온도를 계속 측정하기 위해 피실험자들은 초소형 온도계가 들어간 작은 캡슐을 삼켰다. 이후 실험실에 마련된 에어로바이크(실내 사이클)와 트레드밀에 올라 가볍게 몸을 움직였다. 그 사이 실험실 내부 온도와 습도를 서서히 올려 중심온도를 유지하지 못하는 시점을 측정했다.
실험 관계자는 "측정 데이터 분석 결과 저습도·고온에서는 습구온도 25~28℃, 온난·습윤한 환경에서는 30~31℃가 사람이 견디는 더위의 한계였다"며 "온도를 더 높이자 피실험자가 몸의 중심온도를 적절히 유지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비록 건강한 젊은이라도 31℃ 이상이 되면 우려할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나이가 많은 사람들의 경우 온도 상한선이 젊은 사람들보다 더 낮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구팀은 인체가 버티는 기온은 습도에 따라 좌우되기에 지구상 모든 지역에 통용되는 단 하나의 한계치는 없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습도가 높은 곳에서는 설령 기온이 31℃보다 낮더라도 열사병과 탈수에 주의해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현재 기후가 온난화 탓에 계속 변하고 있고 앞으로 심각한 폭염을 부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연구팀 입장이다.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 인구가 많아진 사실도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봤다. 습구온도 상한선 조정치에 맞춰 한여름 온열 질환 주의보 발령 체계 등도 손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이안 기자 anglee@sputnik.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