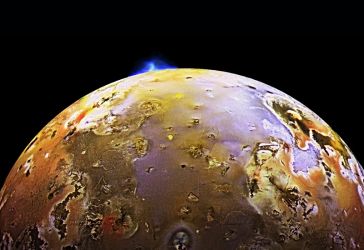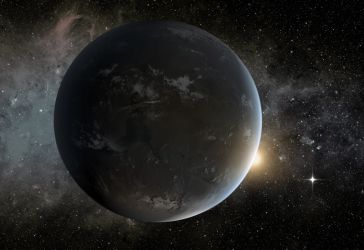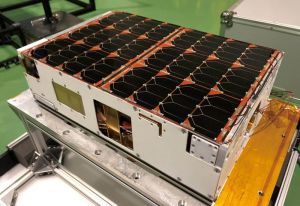요정굴뚝새가 친한 동료는 목숨을 걸고 돕지만 낯선 개체는 철저하게 무시한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
호주 모내시대학교 연구팀은 9일 국제 학술지 '커런트 바이올로지(Current Biology)'에 낸 논문에서 호주 남동부에 사는 고유종 요정굴뚝새가 피아 식별이나 대응 과정에서 계층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과 비슷한 태도를 보인다고 전했다.
연구팀은 인간 사회의 특징인 계층이 동물들에게도 존재하는지 폭넓게 조사해 왔다. 가족과 씨족, 부족 등 원시시대부터 시작된 인간의 계층은 일부 영장류나 고래, 코끼리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새들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지 궁금했던 연구팀은 요정굴뚝새를 대상으로 삼았다. 텃새인 요정굴뚝새는 2~6마리가 하나의 번식 그룹을 짠다. 이것들이 여럿 모여 상위 그룹을 구성한다. 각 그룹들이 다시 상호 작용하는 식으로 요정굴뚝새들은 거대한 계층 사회를 이루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팀은 요정굴뚝새가 이렇게 계층을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가 궁금했다. 인간의 다계층 사회가 탄생한 가장 큰 원인은 협력관계에 의한 이득인데, 이걸 요정굴뚝새들도 이해하는지가 이번 조사의 핵심이었다.
각 계층에 속한 요정굴뚝새 간의 관계를 특정하기 위해 새들의 발에는 개체 식별용 컬러밴드가 부착됐다. 이후 관찰 과정에서 연구팀은 요정굴뚝새가 같은 그룹 동료에게 위기가 닥치면 필사적으로 돕는 사실을 알아냈다.
조사 관계자는 "요정굴뚝새가 포식자에게 쫓길 때 내는 울음소리를 녹음하고 포식자 인형을 통해 들려주자 동료들은 한데 몰려들어 구하려 애썼다"며 "일부 개체는 인형 옆에서 등을 구부리고 펄쩍펄쩍 뛰었다. 이는 동료를 위해 목숨을 행동"이라고 전했다.
연구팀은 다시 동료들에게 애타게 도움을 요청하는 요정굴뚝새 소리를 녹음하고, 이번에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룹에 들려줬다. 그러자 적극적으로 구원의 손길을 내밀던 요정굴뚝새들은 전혀 반응하지 않고 외면했다.

조사 관계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동료를 돕는 것은 동물의 본능 중 하나"라며 "사람과 같이 무리와 계층을 구성해 사는 동물들은 피아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듯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행동 양상은 먼 옛날 수렵채집을 하던 고대인들과 아주 흡사하다"며 "수렵채집을 하던 원시인들은 먹을 것이 생기면 가족, 동료와 나누고, 다음 상위 그룹과 공유했다. 가장 높은 계층 멤버들과 나누는 음식량은 가장 적었다"고 덧붙였다.
연구팀은 요정굴뚝새처럼 다양한 계층을 구성하며 각 계층의 역할을 번식, 먹이활동, 방어 등으로 나누는 동물이 생각보다 많다는 입장이다. 이들의 생태를 더 조사하면 인간이 계층을 구성하고 각 역할에 따라 살아가게 된 기원을 찾을 수 있다고 연구팀은 기대했다.
이윤서 기자 lys@sputnik.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