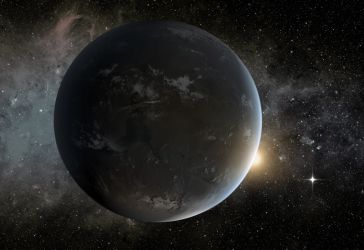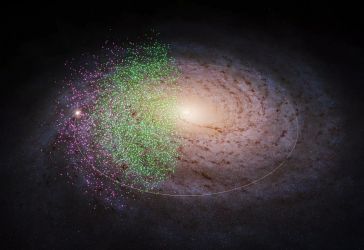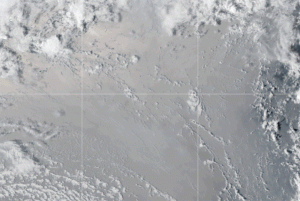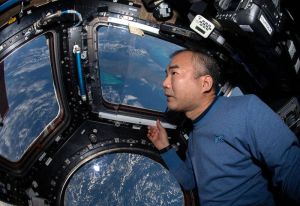공포영화나 귀신의 집 이야기만 나오면 좋아서 흥분하는 사람이 간혹 있다. 시각이나 청각 등으로 느껴지는 공포감은 대개 고통으로 여겨지지만, 이를 찾아서 즐기는 마니아들이 주변에 존재한다. 이를 과학적으로 들여다본 유럽의 한 심리학자는 “적당한 공포는 오히려 흥미를 유발한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덴마크 오르후스대학교 심리학교수 마르크 안데르센은 최근 귀신의 집을 통한 실험 결과, 공포가 적당하면 사람들에게 고통이 아닌 쾌락을 선사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안데르센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덴마크 현지에서 실제 영업 중인 귀신의 집을 섭외한 뒤 피실험자들을 모집, 이들의 실시간 반응과 심박수, 호르몬 분비 여부 등을 관찰했다.
연구팀이 섭외한 귀신의 집은 총 50개 코스로 구성된 규모가 제법 큰 곳이었다. 피실험자들은 이곳에서 좀비나 귀신이 튀어나오고 기괴한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며, 갑자기 괴물이 돌진하는 등 다양한 상황을 체험했다.

심박측정기를 부착한 피실험자들은 귀신의 집 체험이 끝난 뒤 주관적으로 느낀 공포의 정도나 즐거움 등 다양한 감정을 적어 연구팀에 제출했다.
피실험자들이 답한 공포와 즐거움의 관계를 그래프로 그린 결과, 사람들은 공포가 주는 자극이 적절할 때 무서움보다는 즐거움을 느꼈다. 공포감이 부족하거나 반대로 과할 경우 응답자들은 괴롭고 무섭다고 답했다.
안데르센 교수는 “너무 지루하지도 않고 소름끼치지도 않은 ‘적당한 공포감’이 조성되자 사람들은 즐거움을 느꼈다”며 “공포감 속에 기쁨이 최대화되는 일명 ‘스위트 스팟(sweet spot)’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당한 생리학적 일탈이 즐거움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라며 “공포영화를 싫어하는 사람 중에서도 막상 내용이 적당하면 푹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영화가 ‘스위트 스폿’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교수에 따르면, 공포를 통해 적당한 재미를 느끼는 사람의 심박수는 정상 범위이거나 이를 살짝 벗어난 정도였다. 다만 공포감이 크고 일정 시간 계속되면 공포는 즐거움이 아니라 진짜 두려움으로 인식됐다.
이에 대해 안데르센 교수는 “보통 놀이를 하는 사람들을 관찰하면, 본인 예측이 빗나간 경우 배신감과 함께 호기심과 재미를 느낀다”며 “공포영화가 사람 놀라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반전을 심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연구팀은 다만 공포물에 대한 개인차가 커 실험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예컨대 공포영화 주인공이 어두운 지하실로 들어가는 장면을 마니아는 즐기지만, 일반인은 주체 못할 불안에 사로잡힌다. 안데르센 교수는 “당연한 말이지만 사람의 공포감엔 개인차가 있다”며 “공포영화를 아예 못 보는 사람도 있어, 연구 결과가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학계에서는 그간 사람이 공포를 통해 즐거움을 느끼는 생리학적 구조를 알아내기 위한 실험이 이어져 왔다. 전문가들은 심박수 상승이나 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같은 생리학적 자극이 공포영화 마니아가 존재하는 원인 중 하나라고 여겨왔다.
안데르센 교수의 실험결과는 심리학 국제학술지 ‘사이코로지컬 사이언스(Psychological Science)’에도 게재됐다.
정이안 기자 anglee@sputnik.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