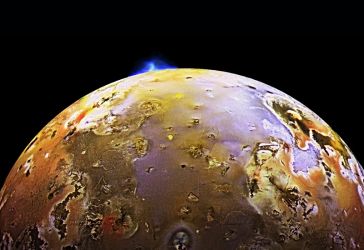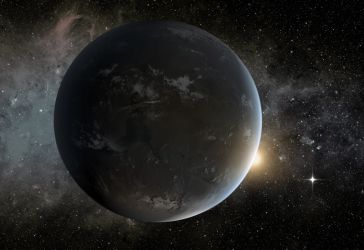인간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로 지구온난화가 지속되면서 야생동물들의 체형이 꾸준히 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물학자들은 이상고온현상에 견디기 위해 동물들이 ‘자구책’으로 체형을 변화시키고 있지만 미처 적응하지 못한 동물들은 멸종을 피하지 못한다고 우려했다.
호주 디킨대학교 연구팀은 최근 국제학술지 ‘트렌드(Trends in Ecology and Evolution)’에 발표한 연구논문에서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체온 조절에 관여하는 야생동물들의 기관이 최대 10% 커졌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야생동물 일부의 신체 특정 부위가 지구온난화에 맞춰 거대화된 사실이 장기간 연구 결과 드러났다. 사람은 무더운 날 땀을 흘려 체온을 떨어뜨리지만 대부분의 동물은 몸 밖으로 돌출된 특정 기관들을 사용해 체온을 조절한다. 코끼리가 커다란 귀를 탁탁 퉁기거나 바람에 노출시키는 건 귀에 분포하는 혈관을 식히기 위해서다.

조사 결과 기관의 거대화는 조류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야생 조류들은 원래 부리에 흐르는 혈류량을 조절해 체온을 낮추는데 지구온난화가 수십 년간 진행되면서 각 지역의 야생 조류 부리가 커진 사실이 관찰됐다.
연구팀 관계자는 “호주에 사는 여러 종의 앵무새는 1871년 이후 부리가 평균 4~10% 커졌다. 분석 결과 이런 변화는 여름철 뜨거운 기온과 상관관계가 인정됐다”며 “북아메리카에 서식하는 검은눈방울새(Junco hyemalis) 역시 부리가 커졌다. 이 외 수많은 종의 부리가 거대화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4에서 10이라는 수치가 인간 입장에선 미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동물들에게는 큰 변화”라며 “가령 체온조절을 위해 사람 다리가 10% 커졌다고 생각하면 아마 난리가 벌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구팀에 따르면 유럽과 아프리카 북서부에 분포하는 고슴도치들은 꼬리가 길어졌다. 북미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고슴도치 무리들은 꼬리와 동시에 다리도 커지고 있다. 꼬리나 다리 모두 체온 조절에 사용되는 기관이다.
학자들은 기후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야생동물들의 몸에 일어나는 급격한 변화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연구팀 관계자는 “이러한 변화는 이제까지의 진화 역사에서 겪어온 것보다 훨씬 짧은 시간대에 일어나고 있다”며 “워낙 단기간이라 적응하지 못해 멸종하는 종이 속출했으며, 이 같은 현상은 향후 더 급격하게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이안 기자 anglee@sputnik.kr